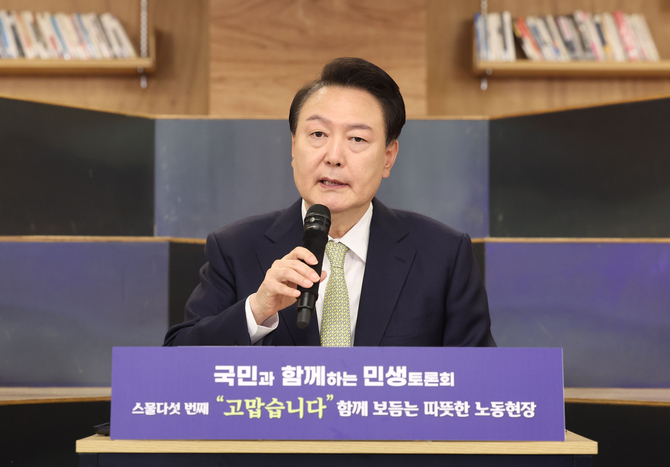(조세금융신문) 2014 년 월드컵은 독일이 우승했다.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예선 탈락했다. 이를 두고 수많은 평론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하는 와중에, 한 아마추어 블로거가 ‘대한민국에서는 명감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글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글의 요지는 이렇다.
외국은 선수 시절의 화려함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리더십 역량, 선수와의 소통 능력, 전략 구사 능력 등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무명 선수 출신 감독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 대한민국은 선수 시절의 명성으로 감독 역량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역 시절 슈퍼스타였던 선수들이 리더십 역량과 상관없이 국가 대표 감독을 맡게 되고 성적은 좋지 않게 된다.
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독일의 뢰브감독은 선수 시절 소속 팀에서 차범근의 백업 멤버에 불과했고 독일 국가 대표로도 선발된 적이 없다. 청소년 대표가 유일한 경력이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도 네덜란드국가대표는 커녕 축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특수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는 투잡족이었다.
2010년 월드컵 당시 4강에 오른 네덜란드 판마르베이크 감독, 우루과이 타바레스 감독, 독일 뢰브 감독은 모두 국가 대표 경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A매치 경기 참석이 1회에 불과한 평범한 선수였다.
박찬호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LA다저스 토미 라소다 감독, 박지성 때문에 잘 알려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화려한 선수시절을 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외국에는 무명 선수 출신 명감독이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넥센의 염경엽 감독이 1할대 출신 타자로서 명감독 반열에 오르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스타플레이어 출신이 감독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라고 모두 감독직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베켄바워, 브라질의 자갈로 등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는 선동렬 감독이 선수시절 팀 우승에 절대적 역할을 하면서도 감독으로서도 팀 우승을 이끈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많지 않다. 스타플레이어 출신 중에 명감독이 적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부족이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스타플레이어 출신들은 선수 시절 자신의 능력에 도취돼 선수들을 일방적으로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 벤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후보 선수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서투르다.
이러한 포용력 부족은 종종 선수들과 불화를 일으킨다. 야구의 윤동균, 축구의 최순호, 농구의 이충희, 배구의 박희상 감독 등은 재임시절 선수들과 크고 작은 마찰 건으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르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임했다.
어떤 팀이 최고의 팀이 되려면 팀워크가 중요한데 스타플레이어 출신 감독은 스타 선수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 팀워크가 깨지기 십상이다. 이렇듯 스타플레이어 출신 감독은 무명선수 출신에 비해 지도력 부분에서는 상대적인 약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업은 어떠한가? 기업에서 팀장이나 임원 등 직책자는 성과가 낮은 직원(Low Performer) 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기업의 인사 시스템은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성과가 낮은 직원을 구조조정 등으로 퇴출시킨다. 무명 선수 출신이 감독직을 맡는 스포츠의 사례는 기업에서 나오기 어렵다.
다시 스포츠로 시야를 돌려보면 감독이 아닌 주장은 스타플레이어가 맡는다. 팀의 주장은 경기 흐름 전체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감독이 지시할 수 없는 소소한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흐름을 끊기 위해 심판에게 항의도 한다.
후보 선수나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실시간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기장 안에서 팀을 이끌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명선수 출신이 감독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무명 선수는 팀의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기업에서 팀장이나 임원 등 직책자는 스포츠 경기의 감독인가, 아니면 주장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성과가 낮은 직원이 팀장으로 승진할 수 없는 점을 본다면 주장이 맞는 것 같고, 부하직원을 평가하고 조직전체를 이끌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을 본다면 감독이 맞는 것 같다.
정답은 없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 후보 선수를 어루만지는 아량과 열린 소통이 있어야지만 그 팀의 팀워크가 유지되고 성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과도 함께 간다는 정서적 공유가 있어야지만 그 팀의 팀워크는 최상을 유지하고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
요즘 기업이 갈수록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은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인문학은 최종적으로 ‘사람’을 지향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