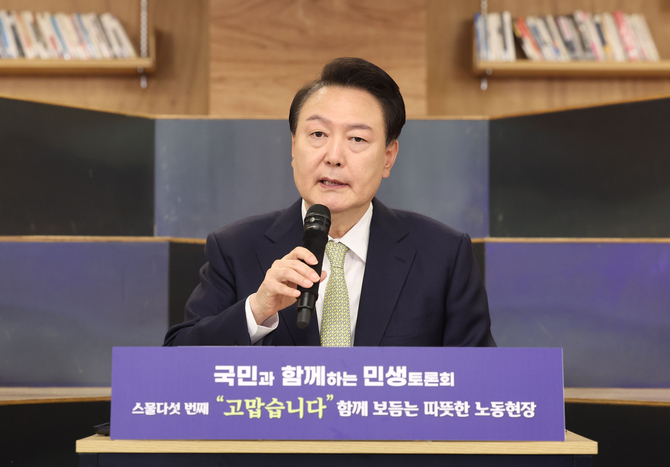(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5G 이동통신 장비 선정을 앞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화웨이 변수’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들은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장비 성능 시험(BMT)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각 사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를 2차 제안요청서(RFP) 발송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장비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2013년 일부 지역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기존에 LTE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G 상용화 시 호환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최근에는 화웨이 장비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권영수 ㈜LG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장비를 예정대로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당시 권 부회장은 LG유플러스가 5G 화웨이 장비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양사의 최고경영자(CEO)들도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5G 통신 장비 선정을 앞두고 SK그룹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중국 사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후문이다. 중국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SK그룹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화웨이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KT는 국가 기간망 사업자였으며 현재도 ‘국민기업’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어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LG유플러스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여론을 의식하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보안이슈? 문제는 가격
현재 정부는 국내 장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우리 산업과 연결돼야 하는데 세계 최초에만 매몰되면 의미가 없지 않겠냐”고 밝힌 바 있다. 국산 장비를 사용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가성비 등의 이유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웨이의 5G 장비는 기술력은 물론 가격에서도 경쟁사를 앞선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IHS 시장조사업체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28% ▲에릭슨 27% ▲노키아 23% ▲ZTE 13% ▲삼성전자 3%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의 5G 장비 기술은 경쟁사를 훨씬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경쟁사보다 20~30% 저렴하다”며 “주요 장비들의 개발이 이미 끝나있는 상태로 상용화 시기나 망 구축 비용을 고려하면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웨이의 보안 우려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각 사업자들은 5G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계속 신중하게 장비업체 및 지역 선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경우 사드 사태처럼 경제적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호주 정부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를 원천 배제하자 중국 정부는 호주 공영방송인 ABC방송의 중국 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또 중국 정부는 현재 추가적 보복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범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쓸 경우 중국의 보복성 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생기니 사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 고심이 클 것”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게 민간 사업 부분까지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