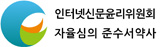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101/art_16098377238314_314772.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연말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파격적인 조건 제시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는 비대면‧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은행권이 ‘몸집 줄이기’에 본격 착수했음을 뜻했다.
그런데 국책은행의 경우 수년째 명예퇴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는 있으나 실제 명퇴한 직원이 없다. 명퇴제도가 ‘사문화’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수출입은행에서는 지난해 연말 기준 2015년 이후 명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14년, 수출입은행은 2010년을 끝으로 명퇴를 원하는 직원이 나오지 않았다.
◇ 열악한 퇴직조건…조직 노화는?
국책은행 직원들이 명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시중은행 대비 빈약한 퇴직금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르면 국책은행 직원의 명퇴금은 ‘공무원 명퇴금 산정 방식’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45%에 퇴직기간의 절반어치를 곱한 값이다. 이는 시중은행 명퇴금과 비교해 20~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책은행 한 관계자는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는다”며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퇴직할 때까지 임피금피크제 직전 받던 연봉을 두 번 정도 나눠 받는데 명퇴하면 훨씬 적다”고 말했다.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명퇴금이 시중은행과 비교해 20%정도밖에 안된다”며 “명퇴보다는 임피제를 선택하는게 당연한거 아니겠나”고 전했다.
임피제는 금융사 별로 만 55~57세가 되면 만 60세인 정년이 될 때까지 해마다 연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제도다. 금융사 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유명무실한 명퇴제가 아닌 임피제가 ‘필수 코스’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사정, 합의점 도출 못 해
이같이 임피제를 선호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국책은행 직원들의 고령자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 노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초 국책은행 노사와 기획재정부는 명퇴제 현실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각 국책은행장이 나서 퇴직금 수준을 올려줄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국책은행 노사는 전체 임피제 기간(3~4년) 중 첫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조건으로 잔여 기간 동안의 급여를 희망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피제 대상 직원 입장에서 명퇴를 선택할 경우 현행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고, 은행 입장에서도 임피제 대상 직원에게 향후 2~3년간 지급될 인센티브나 수당 등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른 금융 공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퇴직금 상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 내 임피 대상자 누적으로 결국 경쟁력이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전 금융권이 금융디지털화에 사활을 걸면서 인건비 축소 등 ‘허리띠 조르기’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 현 국책은행의 행보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또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피제 직원들의 업무 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임피제 직원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도 현장에선 문제다”며 “임피제에 들어가 급여가 줄어들었으면 업무 강도도 낮춰지는게 맞는데 워낙 (임피제 직원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다보니 적합한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