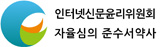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207/art_16765956082528_a63786.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가채무 60% 내에선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60%를 넘어서면 2%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재정건전성 관리가 독보적인 국가로 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에서 관리해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관리재정수지 3% 적자를 본 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단 세 차례 외 없다. 정부는 위기 시 재정을 풀어 국민을 도와야 한다. 위기시엔 가난할 수록 고통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기시 초과 지출은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채택한 재정준칙과 다르다. 다른 주요국들은 현금과 국가자산을 합쳐 적자관리를 하는데 한국은 이중 현금만 따진다.
현금에서 5% 적자가 나도 2%만큼 국가자산을 팔아치워 현금을 채워도 문제되지 않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국가자산 매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 법률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이라며 “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채무 60% 내 적자 3% 관리’ 재정준칙은 1990년대 유로화 통합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가장 재무가 건전하다는 독일이 제일 먼저 깼고, 이후 다른 유럽 주요국들도 줄줄이 깼다.
주요국 재정당국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 영, 프 등 주요국에선 국가채무 60% 선이 깨졌고, 적자 3%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재정준칙이 사문화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