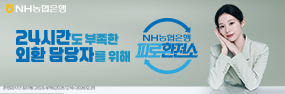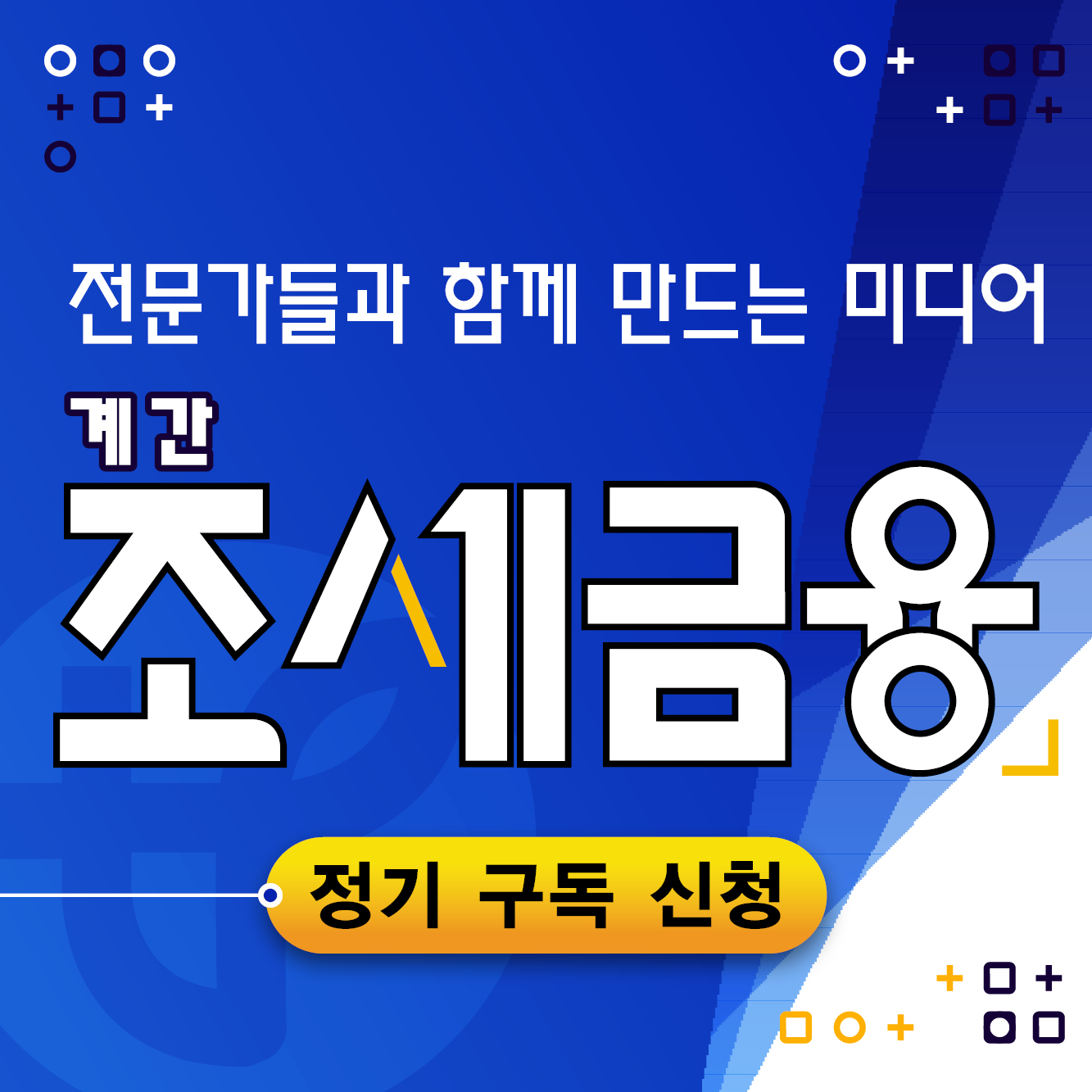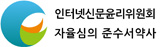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성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간 주도성을 강조했다.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이 맡도록 했고, 상장·상폐 심사 등은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에 맡겼다. ‘민간의 손에 맡기되,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정치적 응답’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이미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이다. 가상자산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다.
금융 인프라의 일부이자, 미래의 디지털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제도 정비에 늦으면 글로벌 기술·자본 생태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입법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모든 경제 주체가 이 흐름을 반기는 건 아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바로 한국은행이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며, 비은행권 발행이 허용될 경우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런 기조 속에 한은은 오는 7월 개최 예정이던 관련 콘퍼런스를 전격 연기하며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온다. “화폐는 누구의 것인가?” 디지털 시대의 통화는 국가의 독점 영역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열 수 있는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린다. “민간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까지는 여러 산을 넘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타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한은과의 조율,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의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미래 금융 질서를 결정짓는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제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 관건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어떤 철학과 원칙으로 이 질서를 설계하느냐다.
정치권, 금융당국, 민간,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때다. 스테이블코인이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든, 지금 이 순간이 화폐의 미래를 좌우할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