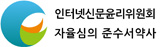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사진=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29/art_16895656648481_61f4ba.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적절한 세금 인상안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 하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력세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
원 취지는 수입가만 세금에 반영되는 수입 맥주와 원가에 홍보‧유통비용까지 반영되는 국산 맥주간 세금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2000원짜리 수입맥주 한 캔과 40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의 세금이 같아진다. 거꾸로 1.8리터 4000원 짜리 국산맥주 피처보다 700밀리리터 3만원 짜리 수입 가향 맥주의 세금이 더 싸지는 효과도 있다. 전자는 서민 맥주지만, 후자는 부유층이 주로 즐긴다.
종량세로 맥주 등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낮아지자 정부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추가했다.
종량세만 있으면 맥주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어 있고, 소주‧위스키와의 형평 문제도 있었다.
소주‧위스키는 종가세에 고율과세까지 부과받으면서 세금이 술값의 세 배, 네 배에 달한다. 외국에서 2만원 짜리 위스키가 국내에서 8만원에 유통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비판에 의해 정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내에서 움직이는 ‘가격변동지수’를 통해 탄력세율 체계를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치솟자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분 이상의 가격인상을 추진했다.
가격에 민감한 막걸리 업계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등 각종 수법을 통해 가격을 대폭 올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자동으로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주세 부과 체계를 꾸릴 방침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세금 때문에 술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술 가격이 오르지 않는 적절한 세금 인상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하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 인상 폭을 낮추면 위스키‧소주와의 세금 격차가 커지고, 세금 인상 폭을 올리면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아주 작은 폭의 세금 인상이라도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반영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다.
기재부는 국회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마저 구상하고 있다.
국회가 조세 형평을 감안해 세금을 인상하면 술 가격에 분노한 유권자 반발이 뒤따를 것이고, 유권자를 의식해 세금 인상을 안 하면 주종간 세금 차별하느냐는 위스키‧소주 업계의 압력을 받게 된다.
물가 관리의 1차적 책임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 있다.
유류세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을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조정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그 정치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겠다고 하고 있어 정책 수립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지난해 교육세를 제외한 주세 신고액은 약 2조8000억원. 맥주‧탁주는 약 1조2000억원, 소주‧위스키는 약 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