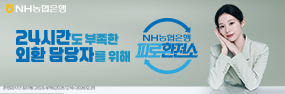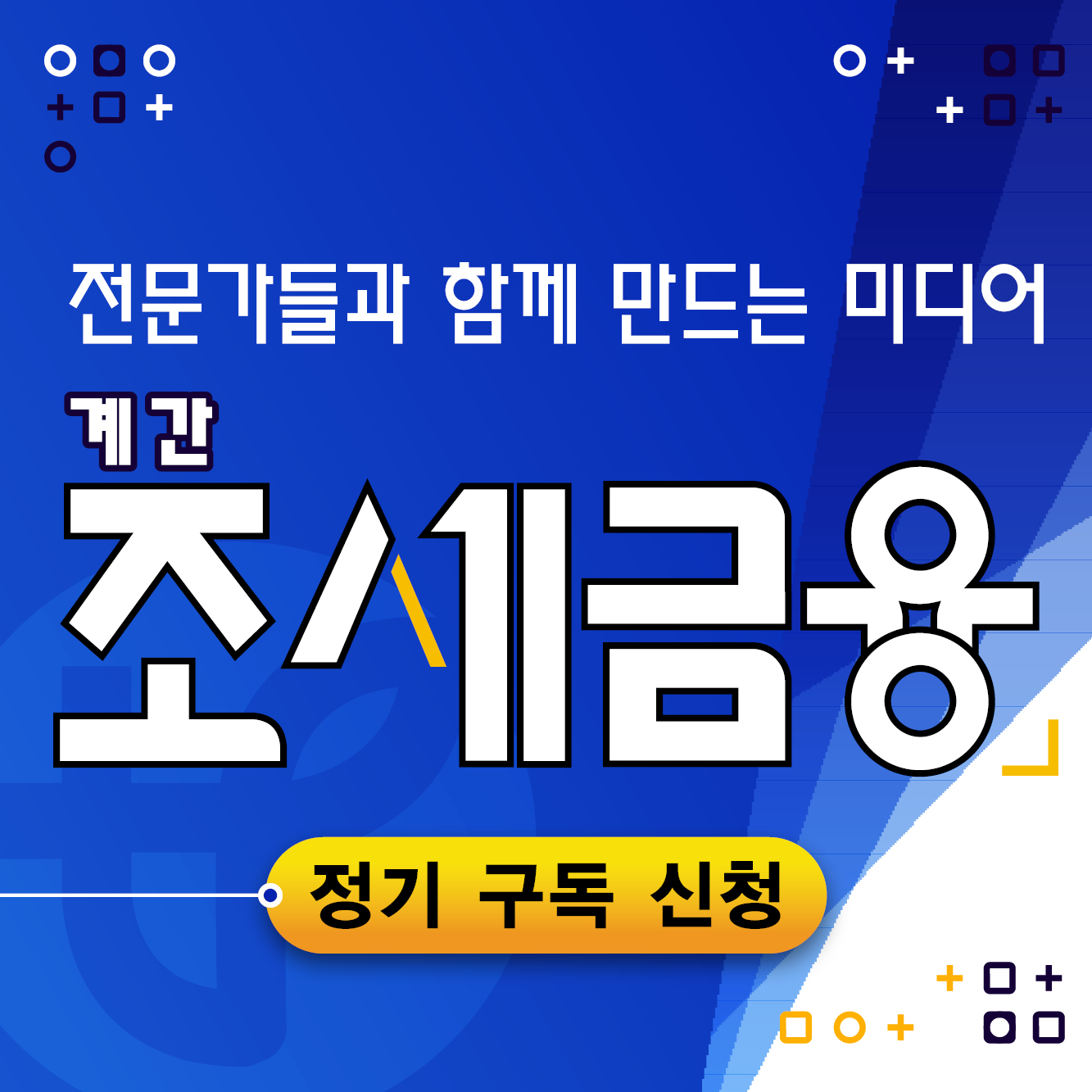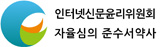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흉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인 '흉선종'을 두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단명은 같지만, 질병코드나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지면서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아래는 본 손해사정사가 흉선종 환우회 회원들과의 인터뷰 및 환우회원들의 보험금 분쟁 사건들을 처리 하면서 느낀 바와 암진단비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
◆ 동일한 진단, 서로 다른 코드 대학병원에서 흉선종으로 진단받은 A씨는 진단서에 경계성종양 코드 D38이 기재되어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받았다. 반면, 다른 대학병원에서 동일한 흉선종 진단을 받은 B씨의 진단서에는 '악성 종양 코드 C37(흉선암)'이 적혔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두 환자 모두에게 유사한 수준의 보험금만을 지급했다. 왜 같은 병인데도 진단명과 보험금이 달라질까? |
▶ 원인은 '기준'의 모호함
이 같은 차이는 '의학 기준'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른다. 그러나 KCD는 일정한 간격으로 개정되며, 그 사이 의사마다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흉선종은 조직학적으로 Type A에서 B3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며, 각 유형마다 악성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침윤 여부, 전이 유무, 성장 양상에 따라 일부 의사는 이를 '경계성 종양(D코드)'으로 판단하고, 다른 일부는 '악성 종양(C코드)'로 판단한다.
▶ 보험사는 “침윤·전이 없다면 암 아냐”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암의 핵심 속성인 ‘침윤’과 ‘전이’가 없는 경우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또는 유사암)'으로 판단해 진단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흉선종은 절제술로 치료가 종결되며, 전이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보험사의 이러한 입장은 조직검사상 침윤 및 전이가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 진단서에 C코드가 기재되더라도 실제 보험금 지급에서는 소액 수준의 경계성종양 진단비로 처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
문제는 이러한 해석 차이와 진단 기준의 모호성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보험 가입자는 암 진단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질병코드 하나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흉선종처럼 해석의 여지가 많은 진단은 병리 소견, 수술 기록, 면역조직검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환자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보험전문가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준 정립과 소비자 보호, 모두 필요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명확한 진단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진단서에 기재된 코드가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 환자의 상태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단지 '코드'가 아닌, 진짜 병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프로필] 최윤근 손해사정사
•현)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전) ㈜에이플러스손해사정 수도권파트장
•전) ㈜DB손해보험 장기조사팀
•전) ㈜동부CSI 사고보상팀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