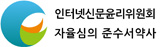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조세금융신문=사샤)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의 고리대금업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주스테 아퀴스타(injuste acquista)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유형의 고래대금 업자는 ‘자신이 쌓은 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이라고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요. 교회는 이들에게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일단 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찾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교회에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고백하고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고리대금업자들은 왜 어렵게 모은 돈을 교회에 주려고 했을까
1200년도 초·중반 이탈리아에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교회건물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 기부한 신도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곤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십일조를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일조는 자신의 수입의 1/10을 교회에 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가령 자신의 소유지인 땅에 교회를 짓게 해준 신도에게, 교회는 십일조를 징수할 권한을 줬습니다. 교회는 이를 두고 후원법 혹은 후원권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Jus patronatus라고 부르는 이 법에 따라 교회를 지어준 신도는 다른 신도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틴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patron은 불어로 파트롱이라고 불리는 후원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지금은 파트롱을 예술가들에게 후원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지만, 원래는 교회에 대한 후원을 의미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 당시 신도들의 기부를 선량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 같은 것이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면서 지불한 일종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야박한 진단인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가진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것인데요.
이 때 돈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상인입니다. 고리대금업과 상업을 겸했던 것이죠. 엄청난 돈을 모았던 피렌체의 상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삶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만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정도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겠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J. K. 넬슨이 밝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당시 거부였던 피에로 델 토발리아라는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은 “살아있는 동안 집에 2000플로린을 쓴다면 500플로린 정도는 편안한 사후를 위해 교회에 후원해야겠지”라고 했답니다. 플로린은 유럽 최초로 주조된 금화로, 실제 화폐라는 보통명사로도 쓰였습니다. 리처드 A. 골드웨이트의 《르네상스 피렌체의 경제》라는 책을 보면, 1300년 당시 하루 일당이 3솔디(soldi)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고액권인 금화를 사용했고, 서민들은 ‘솔디’나 ‘다리우스’라고 하는 은화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보면, 피에로 델 토발리아가 교회 기부금으로 흔쾌히 내겠다던 플로린은 하루 일당으로 3솔디를 받는 사람이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않고 8333일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액수의 돈인 것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피에로 델 토발리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던 부자 상인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지혜로운 교황이 놓칠 리가 없었겠죠. 1244년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우스 4세는 칙령을 내려 신앙심이 두터운 평신도들의 시신을 수도원 지하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성스러운 교회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평화로운 사후세계를 보장받는 것이기에 상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법은 성인이나 고위 성직자 이외에는 교회 매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인에게 교회매장을 허락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회 내부를 그림으로 장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제들에게 평생 봉급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수도원의 벽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것에는 이런 교회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너도나도 그림을 그려대니 화가들이 엄청난 일거리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후학들을 양성하기에 정신이 없게 되었겠죠. 원래는 돈 보기를 돌 같이 하는 수도사들도 많았기에 이런 불편한 상황을 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도나도 나서게 되면서 교회의 금전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갔고 결국은 상인의 금전적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상인의 욕망이 자리를 잡게 되자 교회는 예술가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었고 예술가들은 예술이라 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의 고서점들을 뒤지다 찾은 것이 키케로나 세네카의 작품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상인과 교회 그리고 예술가들이 연결되었을까요? 우선 표를 보시죠. 익숙한 이름들과 장소들이 대거 등장하죠? 당연히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활동하였던 예술가들이 유명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성당들도 이탈리아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 중 한 곳 정도는 방문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두 돌아보셨던 분이 계실 거고요. 이에 비해 주문자들은 좀 낯설지 않나요? 물론 메디치 가문이나 마키아벨리는 너무 유명하니 익숙하실 거구요. 이들이 서로 어떤 연관 속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만들어 갔는지는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