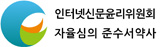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보티첼리의 동방 박사의 경배(Adoration of the Magi), 여러 세대의 메디치 가족과 그들의 가까운 조력자들이 등장한다.<br>
[사진=HowStuffWorks]](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103/art_16739235890021_3fd13e.jpg)
(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호부터 세 차례 메디치은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치은행이 무엇하는 은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죠. “대출업자는 어떤 면에서 매춘부와 같았다. 떳떳하게 방문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가긴 갔다.” 역사학을 사화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긴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출업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앞서 은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라는 말도 사용했었습니다. 은행업자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환전상과 상인 같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했지만 모두 이탈리아 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틀렸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호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출업이나 환전업을 하더라도 구별되는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크게 보아 길드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메디치은행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탈리아 은행가들은 즉 대출업자 혹은 상인, 환전상들은 한데 모여 일했습니다. 여럿이서 탁자를 즐비하게 늘어놓고 사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니 그 거리를 스트리트라고 부를 만하죠. 여하튼 한데 모여 좌판을 깔고 영업을 하던 곳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메르카도 누오보 주변, 오르산 미켈레였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70여 개 정도 되는 좌판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폰테 베키오와 당시 채 완공되지 않았던 두오모 성당 중간 즈음에 차양이 쳐진 현관 아래나 기둥, 그리고 궁전의 문 뒤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빨간 가운을 걸치고 영업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네요. 탁자는 녹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환전상 길드들은 모든 거래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메디치은행의 성공비결 첫 번째 ‘장부 기입 방식’
여담이지만 아리비아 숫자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로마자 숫자로 거래를 표기했었는데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메디치 가문의 성공적인 은행업의 영업비밀 중 하나가 바로 장부를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메디치가문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피보나치가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피보나치 수열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장부를 리브레 세그레티(libre segreti)라고 불렀는데 다름 아닌 비밀 장부란 뜻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개별 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했던 모양인데, 이는 모두 환전상 길드 조직 덕분이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규율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동업자들 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속였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길드에서 추방해 버렸다고 합니다. 은행도 각기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령 아치형 문에 붉은 천이 걸린 곳은 전당포입니다. 이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당포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 정해준 이자율로 빌려주던지 아니면 세간살이를 담보로 맡아두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서민들과 거래하던 사람이겠죠. 담보로 잡힌 물건이 나막신, 결혼 예물 서랍장, 여자 옷 등이라고 기록에 남은 것을 보니 그렇네요. 메디치은행은 전당포 사람이 아니죠. 메디치은행은 주로 귀족이나 성직자들과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원성을 살 일이 없었겠죠. 사실 전당포 사람들이 가장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당포업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환전상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영업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법인세라고 할 수 있는데 벌금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기독교 사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떠 올리면 되겠네요. 전당포 업자들에 비하면 소형은행 사람들은 대출도 했고 소액이지만 예금도 받았습니다.
이들 소형은행을 가리켜 반체 아 미누토(banche a minuto)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했던 영업에는 지금의 금은방 같은 역할도 있었습니다. 귀금속을 팔았죠. 그리고 강제 예치금 같은 명목으로 예금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화나 은화를 바꾸는 환전 업무도 했었습니다. 화폐 업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방금 환전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그런 의미의 환전도 있었지만, 고액권과 소액권의 바꿈도 했었습니다.
왜 이걸 환전이라고 부르냐고요? 1만원을 10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걸 환전이라고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화폐였기 때문이었죠. 간단히 말해 금화인 플로린을 사용하는 사람과 은화인 피치올라, 즉 리라를 쓰는 사람은 다른 계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디치은행의 이야기가 재미있지만, 메디치은행은 금화인 플로린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메디치은행이야기는 전부 귀족이나 성직자 혹은 부유한 상인이 주인공인 이야기여서 일반 서민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부수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화폐사에서는 이를 두고 소액권 또는 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근대적 법정화폐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균등하게 나눠 화폐유통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메디치은행의 성공비결 두 번째, 환어음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우리는 지금 메디치은행이 어떤 배경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치은행은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도 들어봤을 법한 은행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답은 바로 고액권과 소액권의 분리, 즉 어떤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종분리가 이루어지는 관행을 혁명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1397년 메디치은행을 세운 사람은 죠반니 디 비찌 데 메디치입니다. 죠반니도 이런 관행 때문에 골치깨나 썩었습니다. 양모사업을 주로 했었는데요. 양모는 영국과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면직물을 생산하는 나라로 알려졌지만 원래 영국은 양털로 옷을 해 입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양모 축제를 하고 있죠. 메디치 가문이 양모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복식부기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플로린으로만 거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모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플로린을 주면 되지만 직원들 봉급이나 지불해야 하는 돈들은 피치올라로 해결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화폐 시스템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연스레 들었던 것입니다. 실물을 취급하는 전당포 사람들은 문제없었지만, 플로린과 피치올라를 함께 취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플로린과 피치올라 사이의 교환에서 편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면 얼마나 좋을 까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탈리아뿐 아니라 외국 돈과의 거래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생각이 외국 화폐와의 거래까지 미치게 됩니다. 비찌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메디치은행의 성공 비밀인 환어음입니다.
환어음의 기막힌 교환술에 대해서 다음 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