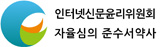그 겨울, 남춘천역_양현근
대합실의 나무의자는
먼지를 끌어안고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펄펄 내리는 눈은 길을 지우고
새벽을 껴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역무원이 느릿느릿 잠을 털며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잔기침소리에 타닥, 타닥 불길이 일었다
허연 입김을 내뿜는 아저씨를 배경으로
등 굽은 노인이 급하지 않은 이정표를 뒤적거렸다
기차는 오지 않고 눈발은 풍경을 하얗게 지우는데
발목이 젖은 사람들 난로에 둘러앉아 온기를 껴입었다
외진 순대국밥집에서 며칠 눈에 파묻혀
막걸리나 몇 사발 걸쳤으면 싶은 날
대설주의보 소식이 분분하게 날리고
어느 설해목 아래 젖은 상처 부둥켜안고
한 사나흘 모진 눈발로 마저 휘날렸으면 싶은데
내내 소식은 오지 않았다
소복하게 기다림이 쌓여갈 때쯤
난로 위의 주전자는 들끓는 입김을 허공에 풀어내고
한 그릇 국밥 같은 소리가 선로 위를 달려오고
부풀어 오르는 발자국들
먼 길 가는 노인의 보따리에
창틈으로 스며든 외풍이 시린 엉덩이를 슬쩍 걸친다
초행길도 같이 기대어 가면 화르르 봄꽃도 될 거라고
몰려오는 졸음이 말없이 그 바람을 당겨 덮고 있다
울퉁불퉁한 사연을 견딘 멍 자국 가뭇한 유리창에
막 나온 국밥처럼 뜨거운 입김이 공손하게 얹히고 있다
눈발은 가뭇없이 내리고
―양현근 시집, 『기다림 근처』 (문학의전당, 2013)
『별을 긷다』 (시선, 2024) 재수록
[詩作 노트]_양현근 시인
젖은 발목들이 나누어 입던 그 겨울의 온기
오래전 춘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눈이 세상의 경계를 지우던 날,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사람들은 하나 둘 남춘천역 대합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는 수없이 얹힌 몸의 무게로 반질거렸고,
먼지를 끌어안은 채 묵묵히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역무원이 느릿하게 지피던 난로 불은
새벽을 껴입고 온 사람들의 안색을 덥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굽은 등으로 이정표를 뒤적이고,
누군가는 허연 입김을 훈장처럼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 섞여 있노라면,
나 또한 한 그루 '설해목(雪害木)'이 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가지의 상처를 부둥켜안고,
이 무심한 눈발 속에서 한 사나흘쯤
속수무책으로 휘날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적막을 깨운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의 수증기,
멀리서 국밥 끓는 소리처럼 다가오던 기차의 진동.
그 소리는 기다림에 지친 몸들을 슬쩍 들어 올리는
다정한 손길 같았습니다.
저마다 울퉁불퉁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지만,
유리창에 서린 뜨거운 입김이 멍 자국을 가리듯,
초행길도 서로 기대어 간다면
언젠가는 봄꽃이 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 시는 그 겨울 남춘천역에서 마주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난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 속으로 눈발은 여전히 흩날리지만,
그때 나누어 입던 온기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