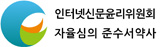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 없듯
가슴 벅차 오르던 감흥도 잠시,
꽃은 처연하게 이미 지고 말았다.
섬진강, 오백여리 그 벚꽃 길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에서 시작하는 섬진강은 소백산맥 산허리를 따라 오백여 리 흘러내려 광양만에서 바다와 만난다. 강은 작은 물줄기로 시작되어 계곡과 여러 실개천물을 보듬으며 세를 불려 강이 되고 바다로 나간다. 섬진강도 그러하다. 켜켜이 얽힌 진안고원 깊은 산골 물줄기들이 개천으로 모이면서 좌포, 음수동을 지나 양화뜰에 이르러 비로소 강의 모습을 갖추어 흐른다.
그렇게 시작된 강은 오백여 리를 흘러내리며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강변마다 사람들의 터전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흘러내리고 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연과 곡절이 있기 마련이다. 필자 역시 유년의 시절 십여 년을 섬진강변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의 아련함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강은 늘 그리움의 대상으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순례하듯 해마다 섬진강을 찾아오곤 한다.
이번 여행길은 남해를 거쳐 하동을 지나 구례 가는 19번 국도를 따라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강 건너 광양매화마을에는 이미 꽃이 지고 새순이 돋아 산기슭은 이미 파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 꽃 보러 간 줄 알아라
_김용택의 시 [봄날]
시리도록 눈부신 꽃들의 향연
4월 섬진강 백여리 벚꽃길은 하동에서 구례로 강을 거슬러 오르든, 구례에서 하동으로 강물 따라 내리든 상관없다. 19번 국도를 따라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곳에서는 눈 부시도록 찬연한 봄날을, 봄꽃을 맞이하게 된다.

섬진강 벚꽃길은 두 차례 장관을 이룬다. 하나는 꽃이 만개하였을 때 끊임없이 이어지는 꽃터널이 그러하고, 또 하나는 바람에 함박눈처럼 꽃잎 날리는 때가 그러하다. 꽃이 피기 시작하여 만개하면 이 길은 해마다 몸살을 앓게 된다.
쌍계사 가는 십여 리 길도 마찬가지다.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만개한 꽃 그늘 밑에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래도 지루해하거나 짜증내는 사람 별로 없다. 정체됨으로써 외려 만개한 벚꽃의 진수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길 따라 늘어선 벚꽃은 작은 바람에도 꽃물결을 일으킨다.
그래도 꽃은 진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아무리 예쁜 꽃도 만개하면 곧 지고 만다는데 화사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벚꽃은 작은 바람에도, 빗방울에도 쉬이 꽃잎을 토해내고 만다.
지리산을 넘지 못한 바람이 섬진강 계곡으로 들어서면 꽃 대궐 이루던 강가에 또 한차례 장관이 펼쳐진다. 바람에 하릴없이 떨어지는 꽃잎은 마치 함박눈 내리던 겨울 어느 날을 연상케 한다.

떨어진 꽃잎은 강물 위를 뒤덮거나 첫순 오르는 차밭 나무에 내려앉아 다시 꽃을 피워낸다. 이쯤이면 감탄하다 못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연의 순리라고는 하지만 그 순리에 우리가 사는 삶도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이 교차되기 때문이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 (중략)
_이형기 시인의 낙화(落花) 중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섬진강의 장관은 벚꽃만 있는 게 아니다. 백운산 넘어가던 하루 해가 마지막 발광(發光)을 하거나 고요한 밤중에 섬광(蟾光)이 들면 강변 백사장의 모래는 빛을 내기 시작한다. 눈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섬진강 백사장의 금모래, 은모래 빛은 물결과 함께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장관을 만들어낸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랫빛
뒷 문 밖에는 달빛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소월의 시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강이 어디 또 있을까? 섬진강 대부분은 암반 위로 강물이 흐르고 있다. 구례쯤 지나면 비로소 드문드문 모래 톳이 보이기 시작하고 화개를 지나서야 제법 넓은 백사장이 나타난다. 섬진강의 백사장 모래는 유난히 더 반짝거린다.

이는 섬진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변성 암층 때문이라고 한다. 변성 암층은 다양한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물살에 의해 그 광물질이 떨어져 나가 잘게 부서지며 모래와 섞이게 된다. 한때 사금 채취가 활발했을 정도로 섬진강 모래에는 광물질이 많아 빛을 받으면 그 반짝거림이 대단하다.
유유자적한 날, 강가의 적당한 곳에 앉아 반짝이는 섬진강 모래빛을 감상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될 거다.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를 흥얼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꽃대궐이 물러나고 나면 섬진강은 겨울 오던 그 어느 날처럼 다시 고요해질 거다.
하지만 강물은 태초부터 지금껏 그래 왔듯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내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적당히 날씨 좋은 어느 날 저 강이 시작하는 곳에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까지 400리 섬진강을 따라 걸어가는 길, 나의 버킷 리스트(bucket list) 가운데 하나이기도다.

*섬진강은 진안, 임실, 순창, 구례, 하동 등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청정지역을 지나는 강이다. 진안고원의 계곡물들이 모여 강의 형태를 이루며 내리다가 남원 요천과 합수하고 보성강과 만나면서 강은 비로소 큰 물줄기가 된다. 강은 경사 깊은 지리산 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다가 광양에 이르러 남해바다와 하나가 된다. 섬진강의 섬진(蟾津)이란 강이름을 한자말 그대로 해석하면 ‘두꺼비 나루’가 된다.
실제 섬진강에는 두꺼비에 대한 전설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蟾(두꺼비 섬) 자를 두꺼비로 해석하기보다는 섬광(蟾光), 섬백(蟾魄)등에 쓰이는 ‘달’로 해석하는 게 섬진강 뜻에 더 어울리는 듯하다. 이는 깊은 밤 산 계곡 위로 떠오르는 달과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섬진강변에서 만나게 되면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