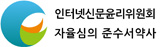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를 거치며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약 2400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 조건이 과거보다 축소된 상황에서도 은행권의 구조 변화와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이탈이 연례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총 23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32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0명 안팎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별 편차는 뚜렷하다. 신한은행이 올해 669명 희망퇴직하며 전년 보다 100명 이상 늘어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에서도 전년 391명보다 증가한 443명이 희망퇴직했다. 반면 국민은행(549명), 우리은행(420명), 하나은행(283명)은 지난해보다 희망퇴직 인원이 소폭 줄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퇴직 조건이 축소됐음에도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희망퇴직자에게 급여의 35~36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지만, 2024년 이후에는 대부분 최대 31개월 치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도 비슷한 조건을 유지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최대 28개월 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은행권을 향한 여론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 장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런 때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이 사회적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은행 내부에서 공유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퇴직자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와 조건이 유사한 2024년 기준 은행별 경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원대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평균 3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3억4918만원), 농협은행(3억2240만원), 신한은행(3억1286만원)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법정 퇴직금(약 1억원 내외)을 포함하면 평균 수령액은 4~5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은행원들이 조건 축소를 감수하면서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구조적 불안도 자리 잡고 있다. 비대면 금융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오프라인 점포와 인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퇴직 조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이 희망퇴직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력 구조 조정이 일시적 이슈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희망퇴직 조건이 유지되고 있을 때 선택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부 은행의 희망퇴직에는 1985년생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인력 조정 범위가 중·장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도입이 본격화될수록 은행권의 조직 슬림화 흐름은 당분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희망퇴직이 일시적 선택지가 아니라 은행 산업 구조 변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은행권 조직 규모를 다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며 “희망퇴직이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인력 운영 전략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