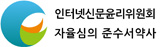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1041/art_16020430944052_c66b32.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재정준칙이 빠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준칙은 연간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지출 상한선이다.
일반적인 재정 원칙은 활황일 때 정부는 시중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불황일 때는 돈을 풀어 경제 마중물을 붓는다. 그러나 경직된 재정 원칙을 가지면, 불황일 때 마중물을 풀지 않아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부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위원회 정세은 충남대 교수에게 기획재정부 재정준칙 방안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의견을 물었다.
정 교수는 “재정준칙을 통한 긴축적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유지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나 통용되던 재정정책 기조”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재정준칙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강하던 때 유행처럼 도입됐다”라며 “2008년 위기가 있고 난 뒤에도 재정준칙을 지키려고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유럽 경제가 장기 부진에 빠졌고, 2013년부터는 IMF조차 경제위기 시기에는 긴축적 재정정책이 문제가 있다며 돌아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제성장률 지원 방안 중 현재 어떤 정책을 써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정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은 경제의 성장능력인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 재정정책을 쓰면 성장률이 줄어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국가채무는 선진국에 비해 1/3정도 밖에 안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강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부채 60% 유지, 연간 부채 증가율 3%’라는 과거의 기준에 집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 때는 세수 회복이 빨랐던 반면 2007년 금융위기 때는 세수회복이 더딘 이유는 기업실적과 자산가치 하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 악순환을 일으킬 재정준칙 도입을 고집하는 기재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지원은 큰 틀에서 금융지원과 직접지원으로 나뉜다. 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직접지원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재난지원금은 재정에 마이너스가 된다.
금융지원은 정부가 민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에 재정에 플러스가 된다. 외환위기 당시 168조원 공적자금이 금융지원 방식으로 흘러갔다.
유동성 측면에서 직접지원이든 금융지원이든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공적자금이 장기 미회수가 되면, 조세지원보다도 못한 불량 채권이 될 수 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돈 가치는 매년 떨어지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기업금융지원 총액은 168조원이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51조원 이상이 미회수 상태다.
기획재정부 재정준칙 방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 60%로 묶고 연간 지출 폭의 마지노 선을 GDP 대비 3%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예외규정으로 재해재난 등 긴급한 사유를 두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