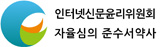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사진=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90936/art_15675891802614_a39ee0.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27개국 중 6위에 달한다.”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가 정부가 법인세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낮추고 있다며 발표한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낮춰 경제활력 살려야’ 자료 일부분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수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기업공제 삭감 탓으로 돌렸다.
법인세수 증가, 공제가 원인?
법인세수는 부가가치(기업 소득), 이윤(기업 영업잉여), 이윤에서 과세소득대상, 과세대상 중 실제 세금부과액으로 구성된다.
GDP 대비 법인세수는 2010년 2.82%, 2011년 3.23%, 2012년 3.19%, 2013년 2.92%, 2014년 2.73%, 2015년 2.72%, 2016년 2.99%, 2017년 3.22%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16~2017년 사이 올랐는데 이 시기 기업 이윤에서 과세소득대상으로 잡는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은 2016년부터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에서 80%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2006~2017년간 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기업이 2018년 1000억원 이익을 거뒀다면 2018년에는 앞서 10년간 발생한 결손금의 100%인 1000억원만큼 공제를 받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도가 80%로 줄면서 20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잡도록 한 것이다.
다만, 한경연의 분석대로 과세표준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에 결정적 이바지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세율이 고정돼있거나 세액공제가 큰 변동이 없다면, 나머지 기업 부가가치, 이윤율, 과세표준 소득 비중이 영향을 미친다.
한경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과세표준 비율은 86.2%, 법인 이윤율은 30.6%, 기업 부가가치는 65.0%였고, 이 시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99%였다.
2017년의 경우 과세표준 비율은 93.3%로 대폭 뛰었지만, 법인 이윤율은 31.4%, 기업부가가치 비중은 65.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22%였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과세표준은 80.1%, 법인 이윤율은 31.4%, 기업부가가치 비중은 63.4%로 기업 소득도 낮고, 과세표준도 작았지만, GDP 대비 법인세율은 3.19%였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각 구성요소의 증감률을 법인세수와 직결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는 법인세수는 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오를수록 유위미한 상승관계가 있었지만, 과세소득 비율이나 법인 이윤율은 회귀식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미가 없었다.
한경연 측은 영업잉여에는 법인 외에도 자영업 부문도 포함되는데, 자영업이었던 부분이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몫이 커졌다며, 그 근거로 연간 법인이 수만 개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 측은 신규 법인 중 대다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은 법인세수 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42만7935개 기업 중 일반법인은 6만4754개(15.1%)로 비중은 작았지만, 법인세 부담액은 41조777억원(80.0%)이었다.
중소기업은 31만641개(84.9%)였지만, 법인세 부담액은 10조2502억원(20.0)에 불과했다.
최고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 개인 자산가들이 자산과 소득을 법인화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위의 국회 예정처 회귀분석 결과는 달랐다.
OECD국가와 기존 연구모형에서는 높은 소득세율을 피해 법인세로 전환하는 성향이 계속 발생하는 경향은 일관되게 관측되지 않았고, 과세표준과 실효세율의 격차가 보다 유의마한 관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과세표준 비율이 높다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 비율이 올라간 2016~2017년을 살펴보면 2016년 GDP 대비 설비투자율은 –1.0%였지만, 반도체 호황이 있던 2017년에는 14.6%로 급성장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투자는 법인세수보다 글로벌 경기여파가 보다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수출기업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전했다.
기업소득 급등, 노동분배율 급락
그럼에도 한국이 다른 OECD국가보다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3.2%였다. 칠레(4.9%), 노르웨이(4.5%), 뉴질랜드·룩셈부르크(4.4%), 일본(4.3%), 체코(3.6%), 슬로바키아공화국(3.5%). 벨기에(3.4%), 멕시코(3.3%)에 이어 10위였다.
연간 GDP가 1조 달러를 넘는 국가 15개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국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정도, 그리고 2014년 4.7%를 기록한 호주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표=국회 예산정책처] 2018 조세수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90936/art_15675890680236_47b0a3.png)
2015년 기준 국내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은 24.3%, 가계비중은 62.3% 정도다. OECD 국가 평균은 기업이 18.8%, 가계가 66.3%다.
한국도 외환위기 전에는 OECD 국가와 비슷했다. 1995년 기준 기업소득 비중은 18.1%, 가계비중은 69.0%였다.
세금 등을 뺀 실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도 기업이 압도적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장기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1999년의 경우 기업이 12.7%, 가계가 12.9%로 서로 엇비슷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지나간 2000~2009년에는 기업이 25.2%나 증가했지만, 개인은 5.7%로 대폭 줄었다.
![[표=국회 예산정책처] 2018 조세수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90936/art_1567589070111_b2d368.png)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노동구조가 기업에 유리한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대거 자영업자가 되고, 고령화로 가계소득기반이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가 지난 2010년~2016년이 돼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7.9%로 진정됐지만, 가계는 5.0%로 더 위축됐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을 기준으로 2016년 소득이 몇 배 늘었는지를 살펴보면 기업은 3.5배 증가한 반면, 가계는 3배 증가한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GNI 내 기업소득에는 세금과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 그리고 근로소득이 지급되기 전 지표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서 급여로 떼어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기업의 가계에 대한 ‘낙수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8월호 노동리뷰에 게재한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무려 9.88%p나 급락했다.
OECD 주요국가들이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07%p 하락한 데 비하면 거의 다섯 배 가량 급락한 것이다.
특히 노동소득은 국내 수요의 근간이며, 기업의 인적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노동인구의 소득약화는 결코 경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이월결손공제나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을 줄였다”면서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국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이 OECD 국가보다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높은 법인세수의 원인이다”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기업이 이익 중에 급여로 나누는 노동분배율이 악화하고, 거기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가계의 몫이 점차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라며 “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가계와 국내 수요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