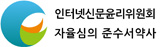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무료급식소 앞에 줄 선 노인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831/art_17224958046342_00696e.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최고의 노인 복지다.
가난은 질병이고, 가난한 노인은 고통받다 죽거나 스스로 죽으니 가난에 대해서도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모양이다.
2013년 1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노인 의료보험 관련 논의 자리에서 ‘죽고 싶은 노인들 빨리 죽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 17일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 시대 우상과 이성을 묻는다’라는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라고 발언했다.
민 소장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고, 서울대 의예과 중퇴, 서울대 인문대 졸업이란 배경을 갖췄고, 지난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으나, 각종 논란으로 사퇴한 자이다.
이들이 특이해서일까.
여기저기에 물어보니
‘적극적 찬성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했다.
개인적 경험이지만, 나이 젊고 많음을 떠나서 그랬다.
이들에게 자살 복지는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
이들에게 나라가 지출하면 할수록 성장을 위한 지출은 줄어든다.
노인 수가 적으면 버틸 수 있지만,
그 수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공멸의 단계로 간다.
공멸로 가지 않으려면 노인 인구의 감소가 필요하다.
물론 토마스 맬서스의 인구론은 깨진 지 오래다.
기술 도약으로 일자리와 국부 총량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적이 없다.
다가오는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시대에
사람은 필요 없고, 부는 더욱 집중되는 세상이 온다.
기술 도약과 국부 총량이 일자리로 연계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 총량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지출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며,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죽기 전 아주 잠깐만이라도 원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자’
라는 존엄사는 제법 합리적이지 않은가.
감세는 의도했든 아니든
이러한 생각을 부추긴다.
국부가 국가 재정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너나 할 것 없는 감세 쇼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임원, 사외이사, 고문, 후원금, 주식, 양도차익
등이 척척 떨어지는 곳에서 벌어진다.
혹자는 저소득자에게도 도움 되는 감세가 있다고 한다.
근로자 74% 이상이 평균 연봉(4236만원)도 못 받는 나라에서
저소득 감세를 해봤자 얼마의 혜택을 받겠는가.
한국은 소득세보다 사회보장기여금(4대 보험료)을 더 걷는 나라다.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은 마련하려 했다. 그래도 힘들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은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보험료를 꾸준히 올렸다. 그 수준이 한국의 1.5배에 달한다(세수 비례기준). 그런데도 아소 다로 재무대신의 노인 자살 발언이 나왔다.
체코는 상속세가 없고, 소득세가 낮다. 대신 사회보장기여금(4대 보험료)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국가 운영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책임진다. 그런데도 연금재정 문제로 최근 연금-물가 연동 체계에 손을 대고 있다.
스웨덴은 한국이 가장 못 닮을 것 같은 나라다. 부가가치세가 높으며, 법인세는 우리랑 비슷한 대신 기업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4대 보험료(사회보장세)를 부담한다. 국부펀드로 연금재정을 충당하는 데 알짜 수익이 북해 유전 지분이다. 인구 1000만명에 고소득 국가인데도 연금 재정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 여당은 증세 대신 감세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합리성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슬그머니 감세에 발을 얹어서
책임회피에 끼려 하고 있다.
성장의 한계에 달한 시기
나치의 레벤스라움은 합리성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고령화 재정이 부족한 시기
한국의 고령화정책은 합리성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까.
한 가지 장담한다.
그때 죽어야 하는 노인 중
상속세 대상은 없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