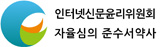|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102/art_15782788163383_109b6c.jpg)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금융당국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뒤바뀌면서 보험사의 경영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장 아래 수익성 개선의 ‘히든카드’로 꼽혔던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몰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시장에 나온 ‘무해지‧저해지환급형’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 보험업계가 유사 상품을 적극 출시하도록 권장했다.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역량이 있는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험사 역시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품이라는 공통의 평가였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오렌지라이프생명이 처음 선보인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과 비교해 만기 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중도 해지 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한 것이 핵심이었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계약을 통해 당장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익보다는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부담이 더욱 심각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감독당국과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판매량은 급증했다. 2015년 3만4000건이었던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신계약은 2018년 176만4000건, 작년 1분기 기준 108만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2019년 1분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도표=금융감독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102/art_1578277260673_723e04.jpg)
신계약보험료도 2015년 58억원에서 2016년 439억원, 2017년 946억원, 2018년 1596억원, 올해 1분기에 992억원으로 집계,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DLF 사태의 불똥이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에 튀면서 비롯됐다. 보험사와 소비자의 ‘WIN-WIN’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판매를 권장했던 금융당국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경보 주의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꾼 가장큰 이유는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최대 20년의 계약기간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초장기 상품인 보험 상품의 특성상 중도해지의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DLF사태와 유사한 중도해지 소비자들의 대량 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패’였다.
상황이 바뀌자 그간 혁신 상품으로 평가받던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를 우려한 수많은 보험사들이 속속 해당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선 것이다.
보험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 자체의 핵심이 고객의 중도해지 리스크를 키우는 대신 보험료를 줄이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며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대비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애초에 만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역량이 있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한 보험 상픔이었으며 그 선택권은 온전히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경보 조치 역시 현재의 조치와 크게 다를바 없다. ‘사전안내 강화’라는 추상적인 방안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현상을 ‘문제’로 인식,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만이 확인되었을 따름이다.
보험업계의 보험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당국은 등대 역할을 한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각종 정책을 고려해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감독과 규제의 틀 아래에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가 ‘정책의 일관성’이다.
초장기 상품인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 감독 정책 역시 장기적인 안목 아래 정해져야 함에도 최근 보험사를 강타한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정책은 이 같은 업계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